〈도사리와 말모이, 우리말의 모든 것〉
돌보지 않았던 우리말 집대성
낱말 배경 풍속 설명도 곁들여
“귀한 말 ‘도사리’ 될까 무서워”
낱말 배경 풍속 설명도 곁들여
“귀한 말 ‘도사리’ 될까 무서워”
〈도사리와 말모이, 우리말의 모든 것〉
장승욱 지음/하늘연못·2만9000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곧잘 우리말을 전세계 사람들에게 으뜸 가는 자랑거리로 내세운다. 특히 외국어로는 옮길 엄두조차 나지 않는 풍부한 표현력이 으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말의 표현력이 어느 정도로 풍부한지 술자리에 앉은 술꾼들의 모습을 보며 직접 한번 확인해보자. 술에 취하는 첫 단계는 ‘우럭우럭하다’는 형용사로 표현된다. 얼굴에 차츰 술기운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좀 더 취하면 거슴츠레 눈시울이 가늘게 처진다. 그 모습을 두고 ‘간잔지런하다’고 말한다. 딱 알맞을 정도로 취한 상태는 ‘거나하다’고 한다. 거나하게 취해 정신이 흐릿한 상태는 ‘건드레하다’거나 ‘얼큰하다’고 한다. 술이 반쯤 취해 건들거리는 모양은 ‘얼근덜근’이다. ‘해닥사그리하다’는 말도 있다. 술이 얼근하게 취해 거나하다는 뜻이란다. 이 단계를 지나 몸을 못 가눌 정도가 되면 ‘곤드레만드레’ 취했다고 한다. “술에 먹히는” 마지막 단계는 ‘곤드라지는’ 것이다. 술에 취해 정신없이 쓰러져 자는 모습이다. 술에 취해 무엇을 생각하려 해도 생각이 날듯 말듯 한 상태는? ‘옹송옹송하다’ 또는 ‘옹송망송하다’고 한다.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취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한 표현들이다. 우리말이 이렇게 재미있고 풍부했던가 하는 생각에, 또 왜 이런 말들을 잘 알지 못했나 하는 생각에 입이 딱 벌어진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또 잘 쓰지도 않는 우리말이 이것들 말고도 얼마나 많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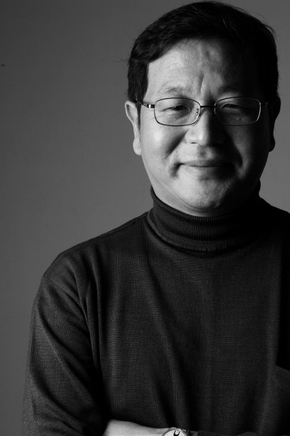 <도사리와 말모이, 우리말의 모든 것>은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우리말을 집대성해 보여주는 책이다. 한글문화연대로부터 제1회 우리말글작가상을 받은 바 있는 지은이 장승욱씨는 그동안 우리말을 끈질기게 연구해온 사람이다. 1997년부터 남북한의 수십 종 국어사전과 어휘·용어사전들을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낱낱이 파헤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특히 사라져갈 위험에 빠진 토속어들을 빼곡히 모아, 말의 배경이 되는 풍속 설명과 함께 주렁주렁 엮어놓았다. 무수히 많은 우리말들을 하나하나 뒤집어보다 보면, 머릿속에선 우리말이 이뤄지는 경험적 법칙이 새겨지고 잊혀져버린 우리네 민중의 생활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임금이 먹는 밥은 수라, 윗사람이 먹는 밥은 진지, 하인이나 종이 먹는 밥은 입시, 귀신이 먹는 밥은 메다. 국이나 물이 없이 먹는 밥은 강다짐, 반찬 없이 먹는 밥은 매나니, 반찬이 소금뿐이면 소금엣밥이다. 남이 먹다 남긴 건 대궁밥, 남 눈치를 보며 먹는 밥은 눈칫밥, 거저 먹는 밥은 공밥. 남의 집에 드나드는 고용살이를 하며 먹는 밥은 드난밥, 논밭에서 김맬 때 집에서 가져다 먹는 밥은 기승밥. 밥그릇 위까지 수북이 담은 밥은 감투밥, 밑에는 다른 밥을 담고 위에 쌀밥을 담은 밥은 고깔밥…. 밥이라는 분야 하나만 봐도 끝없는 변주가 펼쳐진다.
평소에 안다고 생각한 말들 속에도 더 깊은 세계가 있다. 사람이 몰려 북적거리는 곳을 ‘도떼기시장’이라고 하는데, 도떼기는 물건을 나누지 않고 한데 합쳐 사고파는, 오늘날의 도매(都賣)다. 그럼 소매(小賣)는? 물건을 낱낱으로 판다고 해서 낱떼기, 올풀이와 같은 말을 쓴다. 발에 버선이나 양말 대신 감는 무명 헝겊을 ‘감발’이라 한다. 짚신을 신고 감발을 하면? 그게 바로 ‘신발’이다.
<도사리와 말모이, 우리말의 모든 것>은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우리말을 집대성해 보여주는 책이다. 한글문화연대로부터 제1회 우리말글작가상을 받은 바 있는 지은이 장승욱씨는 그동안 우리말을 끈질기게 연구해온 사람이다. 1997년부터 남북한의 수십 종 국어사전과 어휘·용어사전들을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낱낱이 파헤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특히 사라져갈 위험에 빠진 토속어들을 빼곡히 모아, 말의 배경이 되는 풍속 설명과 함께 주렁주렁 엮어놓았다. 무수히 많은 우리말들을 하나하나 뒤집어보다 보면, 머릿속에선 우리말이 이뤄지는 경험적 법칙이 새겨지고 잊혀져버린 우리네 민중의 생활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임금이 먹는 밥은 수라, 윗사람이 먹는 밥은 진지, 하인이나 종이 먹는 밥은 입시, 귀신이 먹는 밥은 메다. 국이나 물이 없이 먹는 밥은 강다짐, 반찬 없이 먹는 밥은 매나니, 반찬이 소금뿐이면 소금엣밥이다. 남이 먹다 남긴 건 대궁밥, 남 눈치를 보며 먹는 밥은 눈칫밥, 거저 먹는 밥은 공밥. 남의 집에 드나드는 고용살이를 하며 먹는 밥은 드난밥, 논밭에서 김맬 때 집에서 가져다 먹는 밥은 기승밥. 밥그릇 위까지 수북이 담은 밥은 감투밥, 밑에는 다른 밥을 담고 위에 쌀밥을 담은 밥은 고깔밥…. 밥이라는 분야 하나만 봐도 끝없는 변주가 펼쳐진다.
평소에 안다고 생각한 말들 속에도 더 깊은 세계가 있다. 사람이 몰려 북적거리는 곳을 ‘도떼기시장’이라고 하는데, 도떼기는 물건을 나누지 않고 한데 합쳐 사고파는, 오늘날의 도매(都賣)다. 그럼 소매(小賣)는? 물건을 낱낱으로 판다고 해서 낱떼기, 올풀이와 같은 말을 쓴다. 발에 버선이나 양말 대신 감는 무명 헝겊을 ‘감발’이라 한다. 짚신을 신고 감발을 하면? 그게 바로 ‘신발’이다.
지은이는 책머리에서 “도사리를 한 광주리 모아 팔겠다고 시장 귀퉁이에 나앉아 있는 촌부의 심정”이라고 말한다. 도사리는 또 뭔가. 익는 도중에 바람이나 병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라 한다. 떨어지지 않고 잘 익어가는 열매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잘 돌봐주지만, 도사리는 누군가 줍지 않으면 그대로 버려져 열매가 되지 못한다. 우리말을 쓰는 게 점점 촌스럽고 번거로운 일로 여겨지고 갖가지 외래어와 한자어가 대접받는 지금, 우리말과 우리말 속에 켜켜이 녹아 있는 우리네 풍속이 딱 그 도사리다. 애써 새벽 과수원에 나가서 줍지 않으면, 곧 몰랐던 우리말이라도 배우고 되새겨 생활 속에서 자꾸 쓰지 않으면, 그 자랑스런 우리말은 누군가 거두지 않은 도사리처럼 버려질 뿐이라는 지은이의 안타까운 경고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장승욱 지음/하늘연못·2만9000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곧잘 우리말을 전세계 사람들에게 으뜸 가는 자랑거리로 내세운다. 특히 외국어로는 옮길 엄두조차 나지 않는 풍부한 표현력이 으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말의 표현력이 어느 정도로 풍부한지 술자리에 앉은 술꾼들의 모습을 보며 직접 한번 확인해보자. 술에 취하는 첫 단계는 ‘우럭우럭하다’는 형용사로 표현된다. 얼굴에 차츰 술기운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좀 더 취하면 거슴츠레 눈시울이 가늘게 처진다. 그 모습을 두고 ‘간잔지런하다’고 말한다. 딱 알맞을 정도로 취한 상태는 ‘거나하다’고 한다. 거나하게 취해 정신이 흐릿한 상태는 ‘건드레하다’거나 ‘얼큰하다’고 한다. 술이 반쯤 취해 건들거리는 모양은 ‘얼근덜근’이다. ‘해닥사그리하다’는 말도 있다. 술이 얼근하게 취해 거나하다는 뜻이란다. 이 단계를 지나 몸을 못 가눌 정도가 되면 ‘곤드레만드레’ 취했다고 한다. “술에 먹히는” 마지막 단계는 ‘곤드라지는’ 것이다. 술에 취해 정신없이 쓰러져 자는 모습이다. 술에 취해 무엇을 생각하려 해도 생각이 날듯 말듯 한 상태는? ‘옹송옹송하다’ 또는 ‘옹송망송하다’고 한다.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취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한 표현들이다. 우리말이 이렇게 재미있고 풍부했던가 하는 생각에, 또 왜 이런 말들을 잘 알지 못했나 하는 생각에 입이 딱 벌어진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또 잘 쓰지도 않는 우리말이 이것들 말고도 얼마나 많겠는가!
장승욱씨.
지은이는 책머리에서 “도사리를 한 광주리 모아 팔겠다고 시장 귀퉁이에 나앉아 있는 촌부의 심정”이라고 말한다. 도사리는 또 뭔가. 익는 도중에 바람이나 병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라 한다. 떨어지지 않고 잘 익어가는 열매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잘 돌봐주지만, 도사리는 누군가 줍지 않으면 그대로 버려져 열매가 되지 못한다. 우리말을 쓰는 게 점점 촌스럽고 번거로운 일로 여겨지고 갖가지 외래어와 한자어가 대접받는 지금, 우리말과 우리말 속에 켜켜이 녹아 있는 우리네 풍속이 딱 그 도사리다. 애써 새벽 과수원에 나가서 줍지 않으면, 곧 몰랐던 우리말이라도 배우고 되새겨 생활 속에서 자꾸 쓰지 않으면, 그 자랑스런 우리말은 누군가 거두지 않은 도사리처럼 버려질 뿐이라는 지은이의 안타까운 경고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