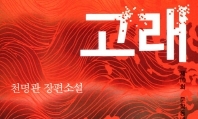주원규의 다독시대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노혜경 지음/실천문학사(2015) 어둠의 밀도와 전야(前夜)는 운명공동체처럼 닮아 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전야를 돌파하는 필연의 촛불은 그 빛을 더 깊게 발한다. 어둠은 늘 그렇듯 진실을 은폐하고 구태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강요한다. 어둠은 때론 놀라운 속도로, 지독할 만큼 지리멸렬한 우리네 삶 깊이 스며든 모순을 망각하게 한다. 그런 게 사람 사는 것이니 모난 돌이 되지 말고 시대에 순응하며 대충 사는 게 좋을 거라고 강조하는 것이 어둠의 본질이다. 하지만 어둠의 기득권자들이 습관처럼 잊고 있는 게 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전야의 긴장감은 더 높아진다는 역사의 진실 말이다. 전야는 이렇듯 치명적 함정과 치명적 희망이 공존해 왔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터무니없이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권력가들의 촌극 앞에서 어둠의 끝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본래의 주권자들은 시대의 야만, 그 어둠의 이름으로 전야를 밝히는 촛불을 끝끝내 밝혀야만 했다. 많은 시인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전야의 밤을 예고하고 또 호소해 왔다. 분명 오늘의 시대에서 시는 무력의 다른 이름이다. 하지만 시는 동시에 전야를 밝히는 시대의 선견이라고 담대히 속삭이고 있음 또한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한다. 노혜경 시인의 시집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역시 무력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날것의 시혼(詩魂), 그 자체다. 그녀의 시는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구분해 논해야 할 것이다. 전작의 시들이 시대정신을 난해한 시어 속에 녹여낸 초현실주의의 형식을 닮아 있다면 이후의 시는 전야의 긴장감과 예언적 실천에 대한 결기로 충만해 있다. 시인은 더 이상 돌려 말하는 법을 부러 잊은 듯하다. 시인은 스스로 자신의 시어를 어둠과 불법, 패악과 부조리의 한파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 시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발버둥친다. 그러한 실천 의지는 이전의 활동에서 보여주던 이념적 성토를 극적으로 전환하여 인간, 그 자체의 절망과 희망의 불가해한 극적 대비를 선고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 맥락에서 그녀의 시들은 더 어두워지고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기 전 불의의 휘장을 찢어내려는 오늘의 촛불과 서글플 정도로 닮았다. 그 경계의 시어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한 무법의 괴물을 소환하고 규탄하는 것을 넘어서서 괴물에 의해 훼손당한 우리네 쓰라린 상흔을 위무(慰撫)하고 있다. 스스로 어둠의 자리에 앉아 이 어둠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2016년 11월26일의 촛불을 망각할 수 없는 전야의 필연으로 기억할지 모른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해야 한다. 어둠의 뒤편에 숨어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든 지리멸렬한 것들로부터의 결별을. 정의가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 앞에서 다시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자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둠을 희망의 전야로 바꾸는 혁명의 길이 되어줄 것이다. 최소한의 사람 사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시는 무력하지만 시대를 밝힌다. 민중의 촛불은 미세한 바람 앞에도 수줍어하지만 그 촛불들이 모여 절망을 밝힌다. 있는 그대로,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주원규 소설가
노혜경 지음/실천문학사(2015) 어둠의 밀도와 전야(前夜)는 운명공동체처럼 닮아 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전야를 돌파하는 필연의 촛불은 그 빛을 더 깊게 발한다. 어둠은 늘 그렇듯 진실을 은폐하고 구태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강요한다. 어둠은 때론 놀라운 속도로, 지독할 만큼 지리멸렬한 우리네 삶 깊이 스며든 모순을 망각하게 한다. 그런 게 사람 사는 것이니 모난 돌이 되지 말고 시대에 순응하며 대충 사는 게 좋을 거라고 강조하는 것이 어둠의 본질이다. 하지만 어둠의 기득권자들이 습관처럼 잊고 있는 게 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전야의 긴장감은 더 높아진다는 역사의 진실 말이다. 전야는 이렇듯 치명적 함정과 치명적 희망이 공존해 왔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터무니없이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권력가들의 촌극 앞에서 어둠의 끝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본래의 주권자들은 시대의 야만, 그 어둠의 이름으로 전야를 밝히는 촛불을 끝끝내 밝혀야만 했다. 많은 시인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전야의 밤을 예고하고 또 호소해 왔다. 분명 오늘의 시대에서 시는 무력의 다른 이름이다. 하지만 시는 동시에 전야를 밝히는 시대의 선견이라고 담대히 속삭이고 있음 또한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한다. 노혜경 시인의 시집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역시 무력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날것의 시혼(詩魂), 그 자체다. 그녀의 시는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구분해 논해야 할 것이다. 전작의 시들이 시대정신을 난해한 시어 속에 녹여낸 초현실주의의 형식을 닮아 있다면 이후의 시는 전야의 긴장감과 예언적 실천에 대한 결기로 충만해 있다. 시인은 더 이상 돌려 말하는 법을 부러 잊은 듯하다. 시인은 스스로 자신의 시어를 어둠과 불법, 패악과 부조리의 한파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 시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발버둥친다. 그러한 실천 의지는 이전의 활동에서 보여주던 이념적 성토를 극적으로 전환하여 인간, 그 자체의 절망과 희망의 불가해한 극적 대비를 선고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 맥락에서 그녀의 시들은 더 어두워지고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기 전 불의의 휘장을 찢어내려는 오늘의 촛불과 서글플 정도로 닮았다. 그 경계의 시어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한 무법의 괴물을 소환하고 규탄하는 것을 넘어서서 괴물에 의해 훼손당한 우리네 쓰라린 상흔을 위무(慰撫)하고 있다. 스스로 어둠의 자리에 앉아 이 어둠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2016년 11월26일의 촛불을 망각할 수 없는 전야의 필연으로 기억할지 모른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해야 한다. 어둠의 뒤편에 숨어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든 지리멸렬한 것들로부터의 결별을. 정의가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 앞에서 다시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자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둠을 희망의 전야로 바꾸는 혁명의 길이 되어줄 것이다. 최소한의 사람 사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시는 무력하지만 시대를 밝힌다. 민중의 촛불은 미세한 바람 앞에도 수줍어하지만 그 촛불들이 모여 절망을 밝힌다. 있는 그대로,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주원규 소설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