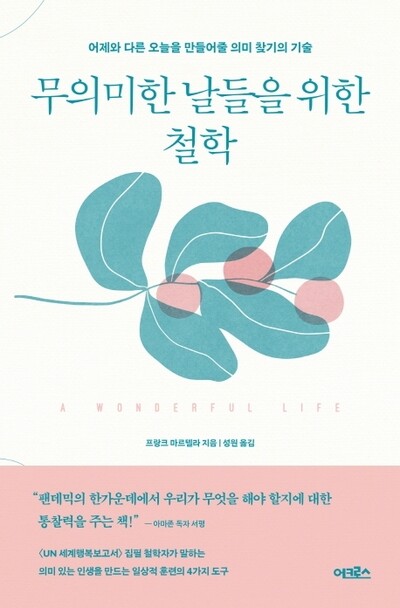
프랑크 마르텔라 지음, 성원 옮김/어크로스·1만5000원 무한한 우주에서 인간은 작디작은 티끌에 불과하다. 그러나 먼지만큼 작은 인간에게 세상은 돌덩이 같은 질문을 안긴다. “당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먼지처럼 하찮아도 의미는 있어야 한다는 모순적 요구다. <무의미한 날들을 위한 철학>은 인간을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이 질문이 어떻게 탄생했고, 인간이 이 질문에 짓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설명하는 책이다. 핀란드 철학자이자 심리학 연구자이며, 유엔(UN)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 집필자를 역임한 지은이 프랑크 마르텔라는 철학자답게 인간의 실존적 불안의 뿌리를 추적하고, 심리학자로서 인간이 좀더 가벼워질 수 있는 마음훈련 방법을 소개한다. ‘인생의 의미’를 묻는 질문은 태곳적부터 있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식이 200년도 안 됐다. 첫 등장은 1834년 토마스 칼라일의 <의상철학>이었다. 빅토리아시대 수필가이자 역사가였던 그가 처음 이 말을 썼을 때는 세계가 격변하는 시기였다. 특히 과학혁명의 여진이 셌다. 중세의 신 중심의 세계관이 연이은 과학적 발명으로 산산이 부서졌는데 이를 대체할 다른 세계관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에게 의미를 부여했던 신이 사라지자 “인간이 내재적 목표나 선, 가치가 없는 생물학적 유기체”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외침은 질문이 아니라 “반발”이었고, 이 ‘반발’이 독일 낭만주의와 결합하면서 “인생에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로 ‘변질’됐다는 게 지은이의 판단이다. 이 질문이 “발명품”이라고 해도 이로부터 놓여나기는 쉽지 않다. 지은이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인생 안에서의 의미’를 찾아라.” 심판자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며 의미를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의미 있게 ‘경험’할 수 있는지 고민하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인생 ‘안’에서의 의미는 자율성·유능감·관계맺음·선의라는 4가지 주춧돌로 세워나갈 수 있다면서 “인생을 프로젝트가 아닌 이야기”로 바라보라고 조언한다. “인생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거머쥐려 하지 말고 (…) 일상의 반짝이는 순간들을 보라.” 최윤아 기자 a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