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지난해 12월30일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요리사 윤정진씨의 사망 소식이었다. 그의 나이 마흔다섯. 음식문화에 관심 있는 이라면 그의 이름 석자는 낯설지 않다. 한국방송 <6시 내고향>에 출연해 전국의 숨은 우리 먹거리를 소개했고, 한식 보편화에도 힘쓴 요리연구가였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또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요리사 ㅈ씨가 보낸 것이었다. 생존율이 높지 않은 희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다. ‘조금만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맞서볼 생각입니다.’ 그도 40대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일상이고, 연예인만큼 인기를 끄는 스타 셰프가 탄생하는 세상이다. 두 요리사의 가슴 아픈 소식은 먹거리가 문화로 자리잡은 이 시대, 요리사들의 작업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호텔이나 일부 고급 레스토랑은 빼자. 외식업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음식점과 레스토랑의 요리사들은 최소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다. 이른 새벽 장을 보고 점심과 저녁 장사를 치러낸 다음, 청소까지 마치면 밤 11시가 훌쩍 넘는다. 하루종일 지지고 볶는 동안 좁은 주방에 가득 찬 연기를 마신다. 제대로 된 환기시설은 매우 중요하다. 부천성모병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김용현 교수는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연기를 마시면 기관지 질환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폐암 발병률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역학조사 결과도 있다. 환기가 안되는 주방이나 방 안에서 일한 인도와 중국의 여성들을 조사해보니 비흡연자였는데도 폐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고 한다. 단지 돈을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 행세를 하는 ‘진상’ 손님도 요리사들에겐 적잖은 스트레스다.
남들이 먹을 때 일하는 이들은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다. 4대 보험이나 산재 처리는 꿈도 못 꾼다. 고용은 늘 불안하다. 그야말로 ‘장사’가 안되면 언제 해고 통보를 받을지 모른다.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결성은 상상도 못한다. “사각지대도 이런 사각지대는 없을걸요.” 한 요리사는 말했다. 지금 마흔 줄에 들어선 요리사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20~30대를 보냈다. 매년 수백명씩 졸업하는 조리학과 학생들은 한번쯤 스타 셰프를 꿈꾼다. 하지만 누구나 연예인 못잖게 유명한 임정식이나 레오 강처럼 될 수는 없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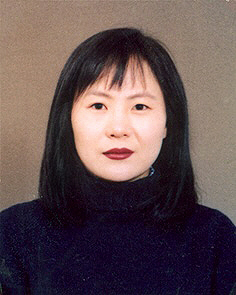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국의 유명 셰프를 초청하거나 한식재단을 만들어 화려한 국외 이벤트를 여는 일이 부쩍 늘었다. 그 돈이 다 제대로 쓰였는지 지금 따져묻지는 않겠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만큼, 이제는 우리 밥상을 책임지는 요리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맛을 소비하는 데 집착해왔다면 맛을 생산하는 이들에게도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다. 밥 짓는 이가 행복해야 먹는 이도 복을 받는다.
ㅈ씨는 요즘 페이스북에 자신이 먹는 항암밥상을 올리고 있다. 암환자와 가족들이 찾아와 친구가 됐다. 그의 밥상에 달걀이 빠져 있자 질 좋은 단백질이 중요하다며 유정란을 보낸 이도 있었다. 그는 그 유정란으로 음식을 만들어 또 페이스북에 올린다. 4월이면 자신의 블로그에 항암 레시피와 암환자들이 갈 만한 건강식당도 소개할 예정이다. 암과 싸우면서도 그는 천생 요리사다. 얼마 전 그는 문자를 또 보내왔다. ‘좀 괘씸한 병이지만 잘 구슬려야죠. 남은 인생도 맛있게 즐겁게 살고 싶어요.’
박미향 기자 mh@hani.co.kr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국의 유명 셰프를 초청하거나 한식재단을 만들어 화려한 국외 이벤트를 여는 일이 부쩍 늘었다. 그 돈이 다 제대로 쓰였는지 지금 따져묻지는 않겠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만큼, 이제는 우리 밥상을 책임지는 요리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맛을 소비하는 데 집착해왔다면 맛을 생산하는 이들에게도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다. 밥 짓는 이가 행복해야 먹는 이도 복을 받는다.
ㅈ씨는 요즘 페이스북에 자신이 먹는 항암밥상을 올리고 있다. 암환자와 가족들이 찾아와 친구가 됐다. 그의 밥상에 달걀이 빠져 있자 질 좋은 단백질이 중요하다며 유정란을 보낸 이도 있었다. 그는 그 유정란으로 음식을 만들어 또 페이스북에 올린다. 4월이면 자신의 블로그에 항암 레시피와 암환자들이 갈 만한 건강식당도 소개할 예정이다. 암과 싸우면서도 그는 천생 요리사다. 얼마 전 그는 문자를 또 보내왔다. ‘좀 괘씸한 병이지만 잘 구슬려야죠. 남은 인생도 맛있게 즐겁게 살고 싶어요.’
박미향 기자 mh@hani.co.kr
박미향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