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채식주의자’의 한 장면.
새 영화 ‘채식주의자’
‘육식 세상’ 부적응자의 죽음에
형부·처제 사랑 이야기 곁들여
한강 원작…임우성 감독 데뷔작
‘육식 세상’ 부적응자의 죽음에
형부·처제 사랑 이야기 곁들여
한강 원작…임우성 감독 데뷔작
나무들이 촉을 틔운다. 겨우내 쌓인 부끄럼을 떨치고 벌린 가지마다 가래토시처럼 촉을 피운다. 웅웅앵앵 벌나비들의 날갯짓. 이윽고 꽃잎이 붉게 흐드러지면 꽃술 깊은 곳에서 젖꿀이 흐를 터이다. 비린내 가득한 봄산.
새 영화 <채식주의자>는 식물이 되어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다.
“이제 알게 됐어. 나무들은 모두 두 팔로 땅을 받치고 있는 거더라구. 모두 다 물구나무서 있는 거야. 언니, 꿈에서 말이야. 내가 물구나무서 있었는데, 내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구, 내 손에서 뿌리가 돋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가랑이 사이에서 꽃이 피려고 해서 다리를 벌렸는데, 활짝, 벌렸는데….”
어데, 사람이 식물이 되겠는가? <채식주의자>는 스스로 식물이 되어간다고 믿는 여인의 이야기다. 영화는 악몽에 시달리던 영혜가 냉장고 속의 모든 고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채식주의를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급기야 이 문제로 가족모임이 열리고 월남전 출신의 아버지는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여인은 자해소동까지 일으키고 결국은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른다.
왜 여인은 남편의 땀구멍마다에서 고기 냄새를 맡으며 잠자리를 거부하는 걸까. “요즘 세상천지에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어딨어? 먹으라면 먹어.” 강제로 고깃덩이를 딸의 입속으로 쑤셔넣는 아버지는 또 어떤 사람일까. 친정 식구들과 자매와 그 남편들이 둘러앉은 밥상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 채식주의자를 이상하게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상징이다. 밥상에서의 소동은 육식주의와 동색인 마초이즘을 폭로한다. 더 나아가 먹고 먹히는 남성 위주로 편성된 사회의 이면에 육식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말한다.
아무렴, 그뿐이면 영화가 휑뎅그렁하지. 사랑 이야기를 빼면 허깨비 아닌가. 육식주의에 넌더리 난 여인은 꽃이 된다. 몽고반점에서 뻗어난 줄기는 등과 가슴에서 꽃으로 활짝 피어난다. 꽃이 되고서야 여인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아 깊은 잠을 잔다. 꽃은 심어진 자리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존재. 오키프가 꽃으로 성기를 그린 것이나, 김중만이 양란에 카메라를 깊이 들이댄 것은 움직이지 않는 꽃의 속성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움직이는 것. 벌과 나비가 없는 인간 세상에서 꽃이 된 여인은 꽃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온몸으로 꽃이 된 남녀의 비디오는 형부와 처제의 사랑이라는 진부한 영화의 공식을 넘는다.
 그럼 그렇지. 원작은 한강의 소설집 <채식주의자>. 육식을 거부하는 ‘채식주의자’, 처제의 몽고반점을 보고 예술적 영감에 휩싸인 비디오 작가 이야기인 ‘몽고반점’, 작가 남편과 여동생의 불륜을 목격하고 갈등하는 ‘나무불꽃’ 등 중편 모음이다. 신예 임우성 감독은 소설에 필이 꽂혀 연작의 끝 ‘나무불꽃’ 탈고 무렵 첫 독자가 되어 시나리오화하기로 찜했다고 전한다. 열성적이기는 배우들도 마찬가지. 채식주의자로 나오는 채민서는 영화를 위해 8㎏ 가까이 살을 뺐다. 팔다리를 벌리면 앙상한 것이 줄기와 가지만 남은 나무처럼 슬프다. 비디오 작가 형부로 나오는 김현성은 반대로 10㎏을 찌웠다. 그래서 무늬만 꽃인 육식성 남자가 됐다.
“이건 말야, 어쩜 꿈일지도 몰라.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그치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되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꿈에서 깨면, 그땐….” 한차례 꽃으로 피었다가 죽어가는 동생을 바라보는 언니의 독백은 그만의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 우리는 정말 꽃인지도 모른다. 꽃인 줄 모르고 피어 사랑하다 지는.
그럼 그렇지. 원작은 한강의 소설집 <채식주의자>. 육식을 거부하는 ‘채식주의자’, 처제의 몽고반점을 보고 예술적 영감에 휩싸인 비디오 작가 이야기인 ‘몽고반점’, 작가 남편과 여동생의 불륜을 목격하고 갈등하는 ‘나무불꽃’ 등 중편 모음이다. 신예 임우성 감독은 소설에 필이 꽂혀 연작의 끝 ‘나무불꽃’ 탈고 무렵 첫 독자가 되어 시나리오화하기로 찜했다고 전한다. 열성적이기는 배우들도 마찬가지. 채식주의자로 나오는 채민서는 영화를 위해 8㎏ 가까이 살을 뺐다. 팔다리를 벌리면 앙상한 것이 줄기와 가지만 남은 나무처럼 슬프다. 비디오 작가 형부로 나오는 김현성은 반대로 10㎏을 찌웠다. 그래서 무늬만 꽃인 육식성 남자가 됐다.
“이건 말야, 어쩜 꿈일지도 몰라.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그치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되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꿈에서 깨면, 그땐….” 한차례 꽃으로 피었다가 죽어가는 동생을 바라보는 언니의 독백은 그만의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 우리는 정말 꽃인지도 모른다. 꽃인 줄 모르고 피어 사랑하다 지는.
순제작비 3억5000만원의 저예산 영화. 18일 개봉. 임종업 선임기자 blitz@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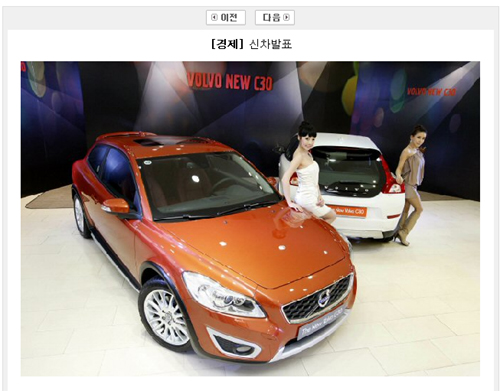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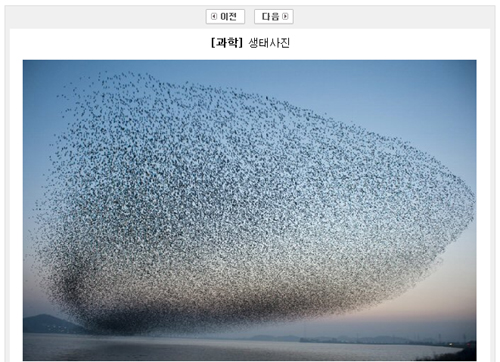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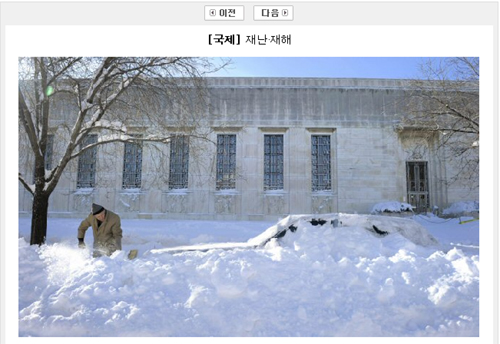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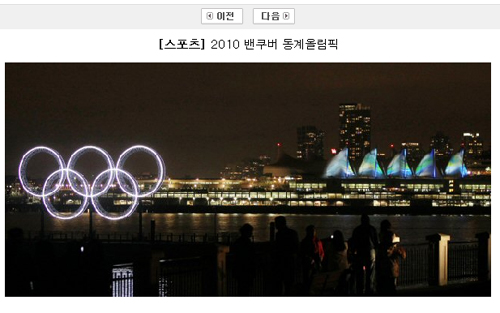
영화 ‘채식주의자’의 한 장면.
순제작비 3억5000만원의 저예산 영화. 18일 개봉. 임종업 선임기자 blitz@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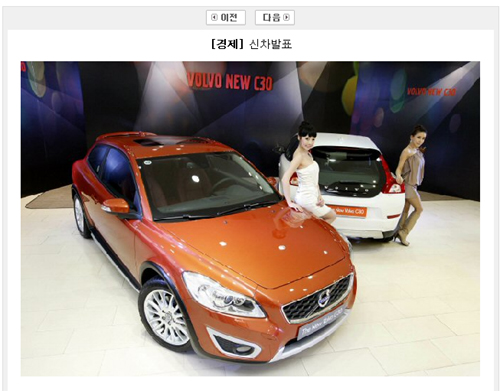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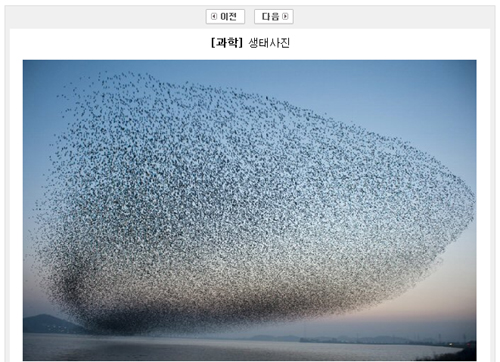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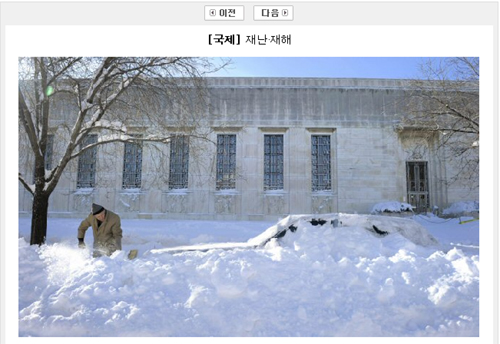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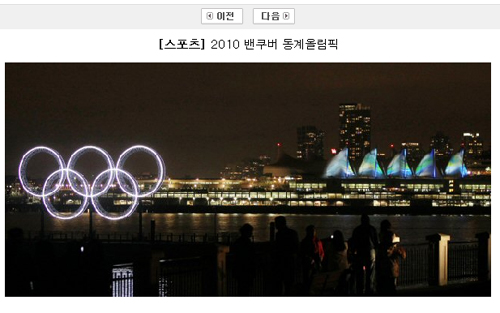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