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가 자꾸 반복되고 있다. 이번엔 경기 용인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올해만 5건의 사고로 16명이 사망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니 참담한 일이다. 사고가 나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고가 재발한다. 이런 패턴이 벌써 몇번째인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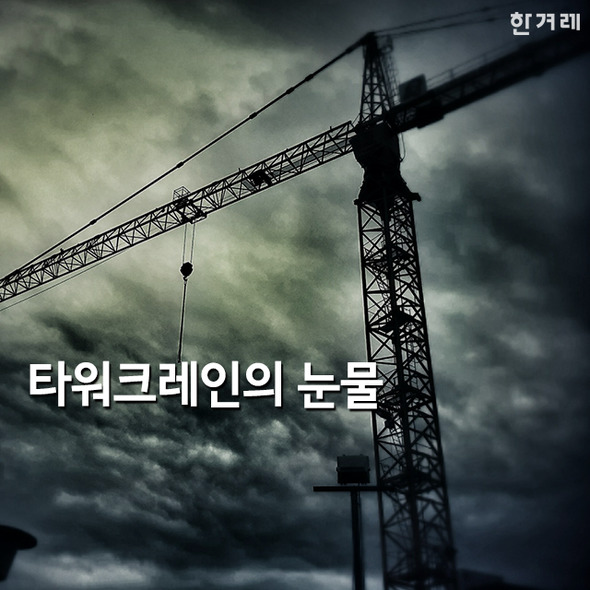 지난 10월 경기 의정부에서 타워크레인 붕괴로 3명이 숨지자 이낙연 총리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시했다. 11월16일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그 전에도 ‘위험경보제’를 도입했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해 공개했다. 문제는 정부가 연거푸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비슷한 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백약이 무효’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여전히 근본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낱낱이 점검해 대책에 구멍이 뚫린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대책을 내놓아도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는다면 그건 ‘탁상공론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이 뭔지 철저히 찾아내야 한다.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이 장비 결함 때문인지, 현장의 안전 소홀 때문인지는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5년 사이에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 대부분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발주처가 강하게 요구하면 현장 하청업체는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 등 하도급에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워크레인은 대형 건설현장 전체 공정의 50%를 넘을 정도로 필수적인 건설기계 장비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가 될 가능성이 큰 ‘하늘의 흉기’인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을 자랑한다는데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고를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 10월 경기 의정부에서 타워크레인 붕괴로 3명이 숨지자 이낙연 총리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시했다. 11월16일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그 전에도 ‘위험경보제’를 도입했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해 공개했다. 문제는 정부가 연거푸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비슷한 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백약이 무효’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여전히 근본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낱낱이 점검해 대책에 구멍이 뚫린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대책을 내놓아도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는다면 그건 ‘탁상공론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이 뭔지 철저히 찾아내야 한다.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이 장비 결함 때문인지, 현장의 안전 소홀 때문인지는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5년 사이에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 대부분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발주처가 강하게 요구하면 현장 하청업체는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 등 하도급에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워크레인은 대형 건설현장 전체 공정의 50%를 넘을 정도로 필수적인 건설기계 장비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가 될 가능성이 큰 ‘하늘의 흉기’인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을 자랑한다는데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고를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한겨레 자료 사진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