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방만한 예산 집행과 소장 교체 외압 논란 끝에 오는 5월 폐쇄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문을 닫게 됐지만 따져봐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사건의 핵심은 관리·감독 없이 장기간 지속된 ‘불투명한 연구소 운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설립된 한미연구소는 지난 11년 동안 2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예산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한두 장짜리 결산보고서만 냈고,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여야가 합의해 올해 3월까지 불투명한 운영사항을 개선하고 보고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예산 지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구소의 최종 관리·감독을 맡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구재회 소장 교체를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미연구소가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오는 6월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연구소 쪽은 청와대가 보수진영과 가까운 구 소장을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하고 보수언론도 이를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앞뒤 사정을 보면 설득력이 높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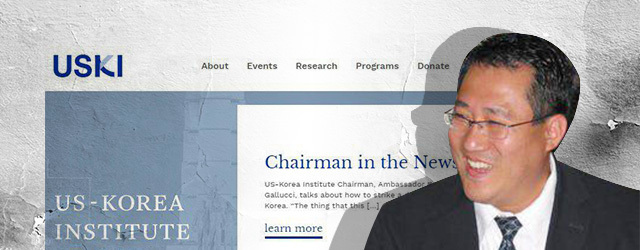 오히려 한미연구소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연구 실적 저조가 문제라는 지난해 국회의 지적이 타당해 보인다. 한미연구소는 설립 이래 구 소장 등의 인건비에 예산 절반을 쓰고 한국학 전문가 양성 등 핵심 사업에는 예산의 4분의 1밖에 배정하지 않았다. 연구소의 2016년 결산보고서를 보면, 애초 사업계획에 없던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와 공동세미나’에 8만달러를 집행하고도 사후 보고가 없었다. 설립 이래 11년째 소장직을 맡고 있는 구 소장이 막대한 국민 세금을 받아 사실상 마음대로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선 정부의 연구소 소장·부소장 퇴진 압력이 너무 무리했다는 주장을 편다. 이 부분은 별도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만 운영 문제를 놔두고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고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어쨌든 연구소가 문을 닫게 됐으니 정부는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반도 전문가 양성이라는 애초 취지에 맞게 예산 지원 계획을 다시 짜기 바란다.
오히려 한미연구소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연구 실적 저조가 문제라는 지난해 국회의 지적이 타당해 보인다. 한미연구소는 설립 이래 구 소장 등의 인건비에 예산 절반을 쓰고 한국학 전문가 양성 등 핵심 사업에는 예산의 4분의 1밖에 배정하지 않았다. 연구소의 2016년 결산보고서를 보면, 애초 사업계획에 없던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와 공동세미나’에 8만달러를 집행하고도 사후 보고가 없었다. 설립 이래 11년째 소장직을 맡고 있는 구 소장이 막대한 국민 세금을 받아 사실상 마음대로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선 정부의 연구소 소장·부소장 퇴진 압력이 너무 무리했다는 주장을 편다. 이 부분은 별도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만 운영 문제를 놔두고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고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어쨌든 연구소가 문을 닫게 됐으니 정부는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반도 전문가 양성이라는 애초 취지에 맞게 예산 지원 계획을 다시 짜기 바란다.
구재회 한미연구소 소장.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