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예술인 복지사업)이 처음 알려졌을 때, 문화예술 종사자는 여기에 적잖은 기대를 걸었다. 아무리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열연을 펼쳐도,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 작품이나 행위가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돌아오는 일은 드물었다. 가난한 예술인에게 매달 100만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3~8개월간 지원한다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사업이 그나마 ‘비빌 언덕’이 됐던 이유다.
기대는 오래지 않아 실망으로 바뀌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재단)은 예술인 복지사업 시행 과정에서 즉흥적인 지원 기준 변경과 무책임한 시간끌기, 형식적인 민원 응대 등으로 되레 많은 예술인에게 상처를 입혔다.(<한겨레> 6월2일치 19면 참고) 예술인재단이 예술인을 상대로 지원 접수를 받기 시작한 것이 2월이었는데, 1차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 건 석 달이 다 된 5월16일이었다. 발표 3일을 앞두고 지원 기준이 느닷없이 바뀌기도 했다.
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예술인재단 누리집의 상담 게시판이 이에 대한 지원자의 항의글로 넘쳐나자 재단은 다른 이들이 항의글을 읽지 못하도록 게시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버렸다. 문화예술인들한텐 일방적이다 못해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행태들이었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이 사업은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던져주는 식의 단순한 ‘구휼’이 아니라 ‘창작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한국 문화예술계의 현실 속에서, 예술인 긴급복지는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가운데 아주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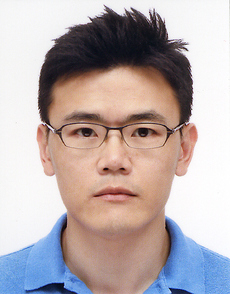 지난 11일 김태훈 문화부 예술국장이 기자들과 만나 예술인 복지사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손보겠다고 약속한 것은 다행이다. 심의 인력을 늘려 지원자 선정기간을 줄이고, 억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재심의(전문심의)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당연한 조처로 여겨진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지원 대상 예술인을 구제가 아닌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다. 예술인 복지사업을 만든 예술인복지법의 취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지난 11일 김태훈 문화부 예술국장이 기자들과 만나 예술인 복지사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손보겠다고 약속한 것은 다행이다. 심의 인력을 늘려 지원자 선정기간을 줄이고, 억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재심의(전문심의)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당연한 조처로 여겨진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지원 대상 예술인을 구제가 아닌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다. 예술인 복지사업을 만든 예술인복지법의 취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최성진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