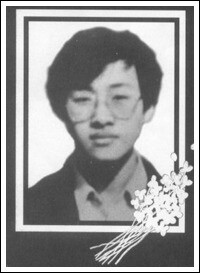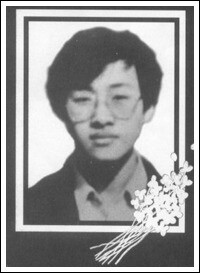고 김성수 열사 생전 모습. 김성수열사기념사업회 제공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 운동 중 의문사를 당한 고 김성수(당시 19살)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군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8월 유족이 총 10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지 약 1년 만에 열린 재판이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군은 1986년 6월21일 저녁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군의 몸에는 시멘트 덩어리가 묶여 있었다. 사망 전 둔기로 때린 흔적이 의심되는 상처도 발견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자살에 따른 익사’로 단정하고 수사를 마쳤다. 의문스러운 김군의 죽음과 수사 결과에 유족은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납득할 만한 자살 이유나 추정될 만한 사인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후 2000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기는 이 사건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했으나 2기 위원회는 서울대 학생 운동 중 반미자주화반파쇼 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 등에 참여한 수배 학생을 검거하려고 김군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공안 관련 기관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군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타살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것이었다. 이에 2006년 민주화보상위원회는 1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보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신적 손해 부분은 당시 보상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약 12년이 지난 2018년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민주화보상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보상 결정이 난 지 약 13년 만에야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소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고 김성수 열사 사건은 고 박종철 열사 사건 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진상이 제대로 밝혀졌다면 박종철 열사는 물론이고 아직 의문사로 인정되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의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며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타살임을 다시 입증해야 하지만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