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고소남발 (상)
‘민팔사건’이란 검찰이 “팔할(80%)이 민사적 성격인 형사고소 사건”을 부르는 곁말(은어)이다. 빌려준 돈을 못 받거나 재산 분쟁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일도 형사고소부터 하고 보는 게 우리의 ‘법 관습’이다. 특히, 신용카드사 등은 형사고발을 교묘하게 이용해 수사기관을 채권추심 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 업무 과중의 주요 원인이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그 실태와 대책을 두 차례로 나눠 짚어본다.
민사성격 강한 ‘민팔사건’
형사 고소사건 ‘단골’
대법 ‘사기죄’ 판결 이후
검찰은 채권추심기관으로 사업 실패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수협에 2630여만원의 빚을 진 윤아무개(59)씨는 지난해 12월 날아온 독촉장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수협으로부터 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채권추심 업체 ㅋ사가 보낸 ‘형사고발 접수통보장’에는 고소장 사본에 한 신문의 기사가 덧붙어 있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사기죄로 기소된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내용이었다. 정아무개(41)씨는 지난해 말 강남경찰서로부터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롯데카드가 롯데백화점에서 화장품 등 470여만원어치를 신용카드로 사고 결제하지 않은 정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정씨는 롯데카드에 이행합의 각서를 써줬고 빚도 절반 갚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정씨에 대한 불기소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돈 받으려 고소 남발하는 신용카드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제외)에 대해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자료를 보면, 2000년 425건으로 크게 줄었던 신용카드 고소 건수는 2001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03년 2000건을 넘고 2004년에는 5222건으로 급증했다. 검찰이 기소한 비율은 22~35%로 일정했으며, 2003년부터 기소율은 줄어들고 있다.(표 참조) 그러나 이는 10개 카드회사 이름으로 검색한 통계여서, 대표이사나 법무팀 이름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 실제 고소 건수는 더 많다. 서울중앙지검 석동현 형사1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단순 연체자에 대해 여러 차례 ‘각하’를 결정한 뒤로는 대형 카드사 무더기 형사고소는 줄어들고 있다”며 “현재 이뤄지는 대부분의 고소는 중소 규모 카드업체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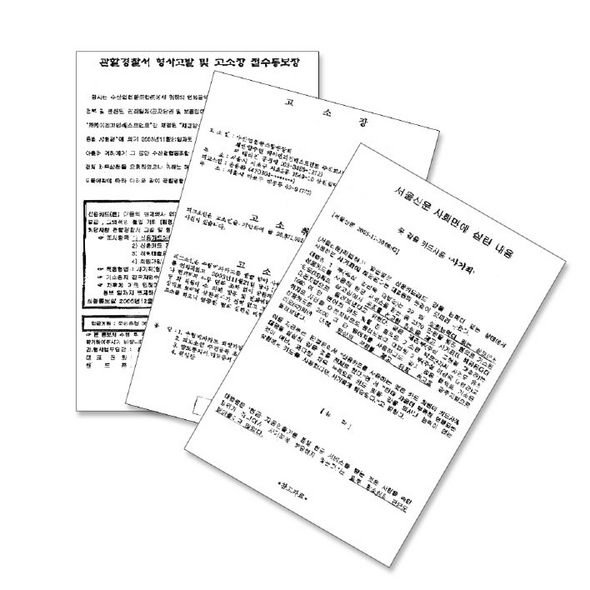
캐피털, 대부업, 홈쇼핑업체 등도 단골=캐피털 업체가 “할부금을 안 갚는다”며 고소하는 일도 최근 잦아졌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이 사기죄 고소를 각하하자 캐피털 업체가 최근에는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권리행사 방해죄란 “타인(캐피털 업체)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할부로 산 자동차)을 그 타인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가거나 숨기는,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캐피털 업체는 사람들이 자동차·가전제품 등 값비싼 소비재를 살 때 구매자 대신 먼저 판매사에 대금을 치르고 그 뒤 구매자로부터 해당 대금에 이자를 붙여 할부로 나눠 받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다.
소액 대부업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내거나 홈쇼핑 업체가 “후불제로 산 뒤 물건만 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할부금을 안 낸다”며 고소하기도 한다. 석 부장검사는 “화장품·의류 통신판매 업체도 이런 ‘할부금 분쟁’ 고소사건의 단골”이라고 말했다. 우려되는 대법 판결=광주지법은 2004년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사기죄로 기소된 연체자에게 “발급 당시 채무가 없는 것처럼 자신의 신용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며 “현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카드회사에 신용상태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기망’ 내지 ‘편취’의 의도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은 “대법원 판결 뒤 지난달까지 ‘대법원 판결 기사가 첨부된 카드빚 독촉장을 받았다’는 제보를 10여 차례 받았다”고 전했다. 고나무 이정애 기자 dokko@hani.co.kr
형사 고소사건 ‘단골’
대법 ‘사기죄’ 판결 이후
검찰은 채권추심기관으로 사업 실패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수협에 2630여만원의 빚을 진 윤아무개(59)씨는 지난해 12월 날아온 독촉장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수협으로부터 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채권추심 업체 ㅋ사가 보낸 ‘형사고발 접수통보장’에는 고소장 사본에 한 신문의 기사가 덧붙어 있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사기죄로 기소된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내용이었다. 정아무개(41)씨는 지난해 말 강남경찰서로부터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롯데카드가 롯데백화점에서 화장품 등 470여만원어치를 신용카드로 사고 결제하지 않은 정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정씨는 롯데카드에 이행합의 각서를 써줬고 빚도 절반 갚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정씨에 대한 불기소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돈 받으려 고소 남발하는 신용카드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제외)에 대해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자료를 보면, 2000년 425건으로 크게 줄었던 신용카드 고소 건수는 2001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03년 2000건을 넘고 2004년에는 5222건으로 급증했다. 검찰이 기소한 비율은 22~35%로 일정했으며, 2003년부터 기소율은 줄어들고 있다.(표 참조) 그러나 이는 10개 카드회사 이름으로 검색한 통계여서, 대표이사나 법무팀 이름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 실제 고소 건수는 더 많다. 서울중앙지검 석동현 형사1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단순 연체자에 대해 여러 차례 ‘각하’를 결정한 뒤로는 대형 카드사 무더기 형사고소는 줄어들고 있다”며 “현재 이뤄지는 대부분의 고소는 중소 규모 카드업체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캐피털, 대부업, 홈쇼핑업체 등도 단골=캐피털 업체가 “할부금을 안 갚는다”며 고소하는 일도 최근 잦아졌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이 사기죄 고소를 각하하자 캐피털 업체가 최근에는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권리행사 방해죄란 “타인(캐피털 업체)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할부로 산 자동차)을 그 타인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가거나 숨기는,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캐피털 업체는 사람들이 자동차·가전제품 등 값비싼 소비재를 살 때 구매자 대신 먼저 판매사에 대금을 치르고 그 뒤 구매자로부터 해당 대금에 이자를 붙여 할부로 나눠 받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다.
소액 대부업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내거나 홈쇼핑 업체가 “후불제로 산 뒤 물건만 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할부금을 안 낸다”며 고소하기도 한다. 석 부장검사는 “화장품·의류 통신판매 업체도 이런 ‘할부금 분쟁’ 고소사건의 단골”이라고 말했다. 우려되는 대법 판결=광주지법은 2004년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사기죄로 기소된 연체자에게 “발급 당시 채무가 없는 것처럼 자신의 신용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며 “현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카드회사에 신용상태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기망’ 내지 ‘편취’의 의도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은 “대법원 판결 뒤 지난달까지 ‘대법원 판결 기사가 첨부된 카드빚 독촉장을 받았다’는 제보를 10여 차례 받았다”고 전했다. 고나무 이정애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