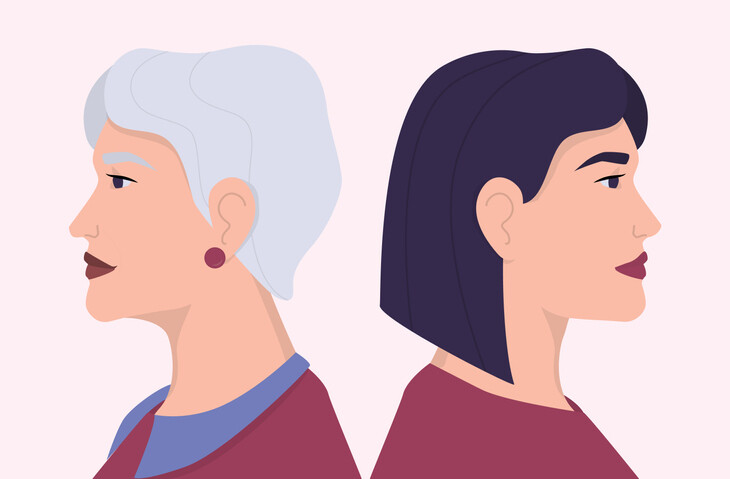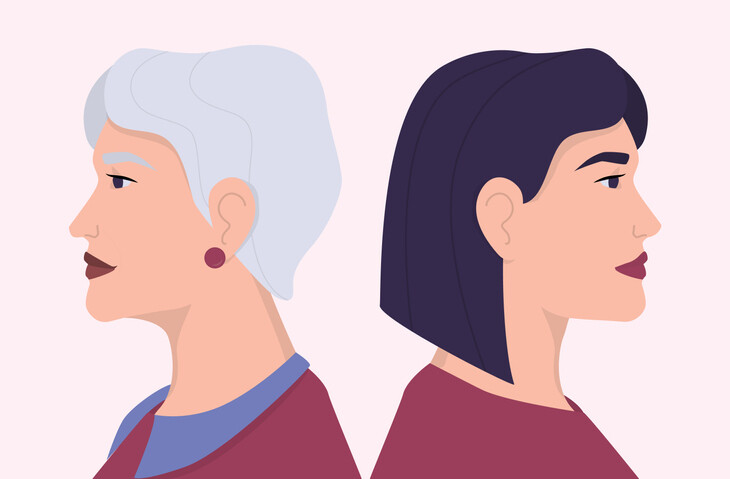[MZ커뮤니티 보고서] 이자연ㅣ대중문화 탐구인
‘시각’이 시간의 한 지점을 말한다면, ‘시간’은 어떤 시각부터 다른 시각까지의 간격을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시각은 특정 포인트를, 시간은 두 지점의 사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소 시각을 알려줄 때 ‘8시 되기 10분 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시각과 시간이 완전히 분리된 개념처럼 보이지만은 않는다. 기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도 우리는 현재를 말할 수 있다. 특이하게도 이 현상은 나이에도 적용된다. 이를테면 반백살.
쉰이 넘는 나이를 뜻하는 ‘반백’은 백살까지 절반쯤 남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백살이 모든 사람의 목표 수명은 아니지만, 인류보편적 예상수명 앞에 남은 거리를 재면서 중년은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성찰한다. 기준점까지 남은 시간은 내가 아직 못해본 걸 해보는 데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기도 한 셈이다. 중요한 건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오십’, ‘반육십’으로 가공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워딩은 주로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서 쓰이고 있는데, 사용자 사이에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신을 ‘할미’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할미에겐 충격적인 요즘 줄임말’, ‘나 반오십 할미라 에스엔에스(SNS) 잘 모르는데 질문 있어’, ‘할미가 10대한테 많이 배운다’ 등 2030 여성들은 자신이 나이 든 사람인 것처럼 굴고 있다. 물론 장난이다. 이렇게 말한들 실제로 자신을 노인으로 인식하는 2030 세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을 나이의 잣대로 가뒀던 ‘크리스마스 케이크’(25살 이상의 여성은 이성적 매력이 없다)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그것의 시작 또한 가벼운 농담이었다. 농담은 그 무게가 가벼워 쉽게 퍼져나가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된다. 농담의 힘 앞에서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게다가 이 말엔 ‘할미’라는 노년 여성에 대한 단편적인 선입견이 그대로 드러난다. 최신 유행을 잘 모르고 더뎌 어린 세대의 가르침이 필요한 모습. 어딘가 모순적이다. 수많은 영상 콘텐츠 속 세련된 노인의 등장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먼 미래에 이상한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젊은 여성이 이토록 많지만 그들은 여전히 노년 여성의 어수룩함만을 빌려와 장난 코드를 만든다.
심지어 반백이 반오십이 되고, 반오십은 더 쪼개지고 있다. 에스엔에스에서 반백부터 내림차순으로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니 반삼십에야 멈췄다. 무려 15살까지 이 언어를 쓰고 있었다. 나이로 제한하는 사회에 지쳤으면서도 또다시 나이로 굴레를 만들다니. 우리 이제 시간 말고, 시각을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