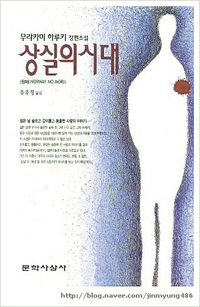
<상실의 시대>
[매거진 Esc] 김연수의 여자여자여자
내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다고 말한 사람은 프리드리히라는 독일 친구였다. 나오코와 미도리. 풋, 나는 프리드리히의 어깨를 툭 쳤다. 이봐, 이 세상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여자들이 있어. 예를 들어 보바리 부인도 있고, 채털리 부인도 있고. 흥! 하지만 프리드리히는 내 말을 콧등으로 받아넘겼다. 하는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때 프리드리히는 이십대 중반의 청년이었으니까.
이십대 초중반의 청년들에게는 여자에 대한 이상야릇한 판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그녀는 내색하지 않을 뿐, 나를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다구”라고 하는 것이다. 사태를 그렇게 복잡하게 보는 건 이십대 초중반의 남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이고, 내가 보기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을 뿐이다. 나를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지 않는 여자.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에 나오는 나오코와 미도리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이야기다.
스무 살 생일에 와타나베와 둘이서 썩 어른스러운 생일 파티를 한 뒤에 잠적한 나오코는 이런 편지를 와타나베에게 보낸다. “지금 나는 아직 너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야.” 그게 만나기 싫다는 뜻이지, 뭐. 그렇다면 미도리 쪽은 어떨까? 와타나베가 초대를 받아 갔을 때, 미도리는 고베 출신인 와타나베를 위해서 간사이식 음식을 선보이고는 자기 집에서는 늘 간사이식으로 음식을 해먹는다고 말한다. 이런 거짓말은 더 캐묻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다. 그러면 소설에서처럼 미도리네 집 옥상에서 불구경을 하면서 키스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문제는 그렇다면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사랑하지 않는지 시급하게 알아내는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 <상실의 시대>는 이십대 초중반의 청년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과서이기도 하다.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를 알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외로움을 말하는 방식이다. 사실 이 소설은 연애소설이 아니라 고독소설이다. 멋지게 붙인 한국어판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두 여자는 외로움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난다. 때가 1960년대 후반인 만큼 이 소설에서는 편지가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먼저 나오코. “외로울 때면 나는 울어 버려. 울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레이코 언니는 말해.” 그 다음, 미도리. “난 다만, 다만 외로울 뿐이에요. 오히려 자기는 내게 여러 가지로 친절을 베풀어줬는데, 내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한 명은 외로움이 해소되고 한 명은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는다.
나중에 미도리는 와타나베를 직접 만나서도 그와 만나지 못한 지난 두 달 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고 쓸쓸했다고 털어놓는다. 여기다 대고 20대 초반 청년은 자기 때문에 화가 나 있어서 만나기 싫어하는 줄 알았다며 ‘깜짝 놀라’ 말한다. 깜짝 놀랐다지만, 이 녀석 별로 놀라지 않았다.
 왜냐면 지금 자기를 갖지 않으면 어딘가로 가버리겠다는 미도리의 협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 연애사건 초기에 나오코가 와타나베에게 한 말이었다. 즉,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완곡한 거절을 뜻한다.
이쯤이면 와타나베도 나오코는 자신의 사랑을 애써 숨기고 있다는 판타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길이다. 이 소설에서 진짜 어른스럽게 사랑하는 두 사람은 와타나베와 레이코 언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소설의 대미를 참으로 어른스럽게 장식한다. 그 일의 숨은 뜻은 레이코 언니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와타나베는 이젠 어른이니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선 확실한 책임감을 가져야 해.” 책임감? 글쎄, 그걸 가지면 청년시절은 끝났다고 볼 수 있을 테니까, 와타나베는 끝까지 자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버티는 것이다.
김연수 /소설가
왜냐면 지금 자기를 갖지 않으면 어딘가로 가버리겠다는 미도리의 협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 연애사건 초기에 나오코가 와타나베에게 한 말이었다. 즉,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완곡한 거절을 뜻한다.
이쯤이면 와타나베도 나오코는 자신의 사랑을 애써 숨기고 있다는 판타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길이다. 이 소설에서 진짜 어른스럽게 사랑하는 두 사람은 와타나베와 레이코 언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소설의 대미를 참으로 어른스럽게 장식한다. 그 일의 숨은 뜻은 레이코 언니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와타나베는 이젠 어른이니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선 확실한 책임감을 가져야 해.” 책임감? 글쎄, 그걸 가지면 청년시절은 끝났다고 볼 수 있을 테니까, 와타나베는 끝까지 자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버티는 것이다.
김연수 /소설가

김연수의 여자여자여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히말라야 트레킹, 일주일 휴가로 가능…코스 딱 알려드림 [ESC] 히말라야 트레킹, 일주일 휴가로 가능…코스 딱 알려드림 [ESC]](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0427/53_17141809656088_20240424503672.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