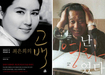〈하느님의 구두〉
장정일의 책 속 이슈/
〈하느님의 구두〉
클리프 에드워즈 지음·최문희 옮김/솔·1만원 빈센트 반 고흐는 매해 새로운 연구물이나 평전이 출간되고 있는 화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음악 분야라면 단연 모차르트다. 암살설과 자살로 점철된 그들의 불행했던 삶 때문인지 모차르트는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는 바흐를 간단히 따돌리고 있고, 고흐는 ‘현대 미술의 아빠’라 해도 좋을 피카소와 상박을 펼치고 있다. 클리프 에드워즈의 〈하느님의 구두〉(솔, 2007)는 고흐에 대한 매혹적인 저작이지만, 경쟁이 치열한 모차르트나 고흐와 같은 ‘레드 오션’ 속에서 독자의 눈도장을 찍으려면 저자의 지명도가 높아야 한다. 예를 들어 그 많은 모차르트 관련서 가운데서도 칼 바르트 정도의 거장이 쓴 거라면 저절로 손이 가게 된다. 참고로 그 책의 제목은 〈칼 바르트가 쓴 모차르트 이야기〉(예솔, 2006). 그런데 클리프 에드워즈처럼 생소한 인물이라면 지갑을 여는 게 멈칫거려진다. 박홍규의 〈내 친구 빈센트〉(소나무, 2006)도 아직 사지 못했는데 말이다. 〈하느님의 구두〉는 고흐에 심취하여 세 권의 연구서를 낸 바 있는 저자의 두 번째 책으로, 그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다. 먼저 후배 화가나 유수의 평론가들이 고흐의 미학적 도전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한때 목사 지망생이기도 했던 고흐가 제기하는 신학적 도전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으며, 또 ‘고흐’ 하면 모두들 그의 방대한 편지를 떠올리지만 누구도 그 편지를 신학 사상의 원천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래 한 인물이나 작품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이 모두 쇠진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설이 제출된다. 그러나 이 책은 정통적인 해석이 오히려 손쉬운 심리분석에 매몰되어 고흐의 진면목을 가려 왔다고 공박한다. 이를테면 〈까마귀가 나는 밀밭〉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노랗게 탄 밀밭을 거대한 도깨비불로, 까마귀를 사악하고 불길한 죽음의 이미지로, 밀밭을 양편으로 나누는 길은 막다른 끝으로 읽으며, 뒤이어 자살을 단행한다는 식이다. 저자는 거기에 반하여 이 그림을 “자연의 복음이며, 대지와 하늘의 시편이고, 둥근 하늘 아래 한데 어우러져 사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노래하는 가을의 찬미가”로 해석한다.
일찍이 고흐가 그린 주인 없는 구두를 놓고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와 미술사가 마이어 샤피로가 논쟁을 벌인 바 있으며, 가로늦게 해체주의 철학자 데리다가 끼어들기도 했다. 고흐를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영성가”로 생각하는
 저자는 고흐가 주인 없는 낡은 구두, 빈 의자, 빈 방, 텅 빈 들녘을 자주 그렸다면서, 그 까닭을 부재 속에서 존재의 충만함을 일구도록 재촉하고 자기만족과 물질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돈 매클린이 불렀던 〈빈센트〉 가운데 “이 세상은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가사가 나오는 것처럼, 고흐는 늘 ‘저주받은 예술가’의 전형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그는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하는 삶”이라고 편지에 썼다. 〈하느님의 구두〉는 고흐의 “기뻐하는 삶”이 비롯한 데와, 그림으로 개종한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을 참으로 감동적으로 제시한다.
장정일 소설가
저자는 고흐가 주인 없는 낡은 구두, 빈 의자, 빈 방, 텅 빈 들녘을 자주 그렸다면서, 그 까닭을 부재 속에서 존재의 충만함을 일구도록 재촉하고 자기만족과 물질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돈 매클린이 불렀던 〈빈센트〉 가운데 “이 세상은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가사가 나오는 것처럼, 고흐는 늘 ‘저주받은 예술가’의 전형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그는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하는 삶”이라고 편지에 썼다. 〈하느님의 구두〉는 고흐의 “기뻐하는 삶”이 비롯한 데와, 그림으로 개종한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을 참으로 감동적으로 제시한다.
장정일 소설가
클리프 에드워즈 지음·최문희 옮김/솔·1만원 빈센트 반 고흐는 매해 새로운 연구물이나 평전이 출간되고 있는 화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음악 분야라면 단연 모차르트다. 암살설과 자살로 점철된 그들의 불행했던 삶 때문인지 모차르트는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는 바흐를 간단히 따돌리고 있고, 고흐는 ‘현대 미술의 아빠’라 해도 좋을 피카소와 상박을 펼치고 있다. 클리프 에드워즈의 〈하느님의 구두〉(솔, 2007)는 고흐에 대한 매혹적인 저작이지만, 경쟁이 치열한 모차르트나 고흐와 같은 ‘레드 오션’ 속에서 독자의 눈도장을 찍으려면 저자의 지명도가 높아야 한다. 예를 들어 그 많은 모차르트 관련서 가운데서도 칼 바르트 정도의 거장이 쓴 거라면 저절로 손이 가게 된다. 참고로 그 책의 제목은 〈칼 바르트가 쓴 모차르트 이야기〉(예솔, 2006). 그런데 클리프 에드워즈처럼 생소한 인물이라면 지갑을 여는 게 멈칫거려진다. 박홍규의 〈내 친구 빈센트〉(소나무, 2006)도 아직 사지 못했는데 말이다. 〈하느님의 구두〉는 고흐에 심취하여 세 권의 연구서를 낸 바 있는 저자의 두 번째 책으로, 그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다. 먼저 후배 화가나 유수의 평론가들이 고흐의 미학적 도전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한때 목사 지망생이기도 했던 고흐가 제기하는 신학적 도전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으며, 또 ‘고흐’ 하면 모두들 그의 방대한 편지를 떠올리지만 누구도 그 편지를 신학 사상의 원천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래 한 인물이나 작품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이 모두 쇠진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설이 제출된다. 그러나 이 책은 정통적인 해석이 오히려 손쉬운 심리분석에 매몰되어 고흐의 진면목을 가려 왔다고 공박한다. 이를테면 〈까마귀가 나는 밀밭〉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노랗게 탄 밀밭을 거대한 도깨비불로, 까마귀를 사악하고 불길한 죽음의 이미지로, 밀밭을 양편으로 나누는 길은 막다른 끝으로 읽으며, 뒤이어 자살을 단행한다는 식이다. 저자는 거기에 반하여 이 그림을 “자연의 복음이며, 대지와 하늘의 시편이고, 둥근 하늘 아래 한데 어우러져 사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노래하는 가을의 찬미가”로 해석한다.
일찍이 고흐가 그린 주인 없는 구두를 놓고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와 미술사가 마이어 샤피로가 논쟁을 벌인 바 있으며, 가로늦게 해체주의 철학자 데리다가 끼어들기도 했다. 고흐를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영성가”로 생각하는
장정일의 책 속 이슈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