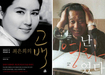〈피가 되고 살이 되는 500권, 피도 살도 안 되는 100권〉
장정일의 책 속 이슈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500권, 피도 살도 안 되는 100권〉
다치바나 다카시 지음/청어람미디어·2만3000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500권, 피도 살도 안 되는 100권〉(청어람미디어, 2008)을 쓴 다치바나 다카시는 일본 학생운동 비사나 정치사건 폭로 작가로 출발해서 현재는 첨단과학 전문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흔히 이런 저술가를 우리는 ‘논픽션 작가’라고 한다. 600여 쪽이 약간 넘는 이번 책은 20대 중반부터 논픽션 작가로 입신할 때까지의 독서 경험과 지적 편력을 털어놓는 1부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주간 문춘〉에 연재했던 신간 서평을 모은 2부로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논픽션이 문학보다 강세긴 하지만, 다치바나가 대학을 다닐 때나, 졸업을 하고서 일본 유수의 주간지에 취직했던 1960년대에 논픽션은 확실히 문학보다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듯이 “내 안에서는 문필세계에 있어서 논픽션을 격하하는 의식”이 한동안 상존했다. 흥미롭게도 “논픽션이라는 범주는 픽션에 대비하여 부를 뭔가가 생겼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발생 기원에 대한 설명 역시, 글쓰기의 대종으로 먼저 문학이 있었고 논픽션은 문학의 서자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500권, 피도 살도 안 되는 100권〉의 2부에는 단 한 권의 문학작품도 거론되지 않으며, 그는 공공연히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한다. 사정은 그의 전작 〈나는 이런 책을 읽어 왔다〉(청어람미디어, 2001)에 이미 설명됐다. 지은이에 따르면 ‘지(知)의 세계’에도 발생과 진화의 계통수가 있는데, 공룡처럼 진화의 정점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더는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사멸해가는 지식세계의 공룡이 바로 19세기의 소설이나 헤겔류의 사변 철학이다. 다치바나는 필자가 긴 독후감을 쓰기도 했던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청어람미디어, 2002)에서 현대의 교양은 도스토옙스키나 실존철학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고 뇌과학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 지점이 논픽션 작가인 그가 당도한 과학전문 저술이다. 나는 다치바나의 주장에 온전히 동의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요즘의 문학작품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처럼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하고 다닐지도 모른다. 논픽션 작가로서 다치바나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입력 대 출력의 비율이 100대 1정도는 되어야 한다면서 “책 한 권을 쓰려면 100권을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공저를 포함해서 그럭저럭 100여 권의 책을 썼으니, 1만 권은 읽은 셈”이란다.
 우리나라 작가들은 공부나 독서를 멀리하면 할수록 ‘순수한 예술’이 내면으로부터 뽑아져 나온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다치바나 같은 이가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영 같은 세계” 곧 “창작물의 세계가 시시하”고 “결국 픽션의 세계, 창작의 세계는 밑바닥이 너무 얕”다고 질타해도 할 말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나 소설이 문필의 대도라고 생각하고, 시인이나 소설가 말고는 작가를 상상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우리나라의 지식 풍토다.
장정일 소설가
우리나라 작가들은 공부나 독서를 멀리하면 할수록 ‘순수한 예술’이 내면으로부터 뽑아져 나온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다치바나 같은 이가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영 같은 세계” 곧 “창작물의 세계가 시시하”고 “결국 픽션의 세계, 창작의 세계는 밑바닥이 너무 얕”다고 질타해도 할 말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나 소설이 문필의 대도라고 생각하고, 시인이나 소설가 말고는 작가를 상상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우리나라의 지식 풍토다.
장정일 소설가
다치바나 다카시 지음/청어람미디어·2만3000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500권, 피도 살도 안 되는 100권〉(청어람미디어, 2008)을 쓴 다치바나 다카시는 일본 학생운동 비사나 정치사건 폭로 작가로 출발해서 현재는 첨단과학 전문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흔히 이런 저술가를 우리는 ‘논픽션 작가’라고 한다. 600여 쪽이 약간 넘는 이번 책은 20대 중반부터 논픽션 작가로 입신할 때까지의 독서 경험과 지적 편력을 털어놓는 1부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주간 문춘〉에 연재했던 신간 서평을 모은 2부로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논픽션이 문학보다 강세긴 하지만, 다치바나가 대학을 다닐 때나, 졸업을 하고서 일본 유수의 주간지에 취직했던 1960년대에 논픽션은 확실히 문학보다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듯이 “내 안에서는 문필세계에 있어서 논픽션을 격하하는 의식”이 한동안 상존했다. 흥미롭게도 “논픽션이라는 범주는 픽션에 대비하여 부를 뭔가가 생겼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발생 기원에 대한 설명 역시, 글쓰기의 대종으로 먼저 문학이 있었고 논픽션은 문학의 서자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500권, 피도 살도 안 되는 100권〉의 2부에는 단 한 권의 문학작품도 거론되지 않으며, 그는 공공연히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한다. 사정은 그의 전작 〈나는 이런 책을 읽어 왔다〉(청어람미디어, 2001)에 이미 설명됐다. 지은이에 따르면 ‘지(知)의 세계’에도 발생과 진화의 계통수가 있는데, 공룡처럼 진화의 정점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더는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사멸해가는 지식세계의 공룡이 바로 19세기의 소설이나 헤겔류의 사변 철학이다. 다치바나는 필자가 긴 독후감을 쓰기도 했던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청어람미디어, 2002)에서 현대의 교양은 도스토옙스키나 실존철학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고 뇌과학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 지점이 논픽션 작가인 그가 당도한 과학전문 저술이다. 나는 다치바나의 주장에 온전히 동의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요즘의 문학작품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처럼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하고 다닐지도 모른다. 논픽션 작가로서 다치바나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입력 대 출력의 비율이 100대 1정도는 되어야 한다면서 “책 한 권을 쓰려면 100권을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공저를 포함해서 그럭저럭 100여 권의 책을 썼으니, 1만 권은 읽은 셈”이란다.
장정일의 책 속 이슈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